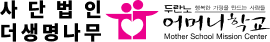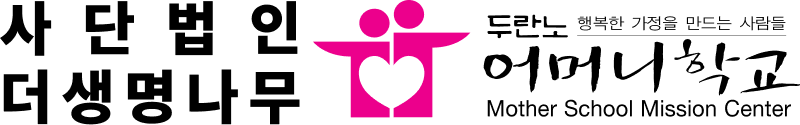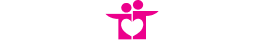게시판
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만드는
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세상
회지MOTHER
배움.눈물을 감사로 바꾸다
- 작성자
- 양정란
- 작성일
- 16-11-10
- 조회수
- 2,065

배움·눈물을
감사로 바꾸다
글 ● 양정란(편집부)
“선생님! 제발 우리 언니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. 글 좀 해 주세요. 그 자식들이 에미 속 좀 알게...” 70대 어르신이 80대 중반의 언니를 위해 반 년 동안 나에게 부탁했던 말이다. 한 학기만 봉사하리라 마음먹었건만, 외면 할 수 없어 2년째 OO재단에서 노인대상 강의를 하게 되었다.
첫 시간. 70대는 청년, 80대는 장년, 90대를 노년으로 여기는 어르신들과의 수업은 나를 소진시켰다. 『쉽고, 재미있고, 가치있게』를 주장하는 교육철학은 딜레마에 빠진 후 헤어날 줄 몰랐으니, 수업이 기도제목이 될 줄이야...
‘쉽게 접목하는 방법은? 노년기 특성이 뭐였더라?’ 고민을 맵핑하며 한 고개 넘으니, 눈물이 봇물같이 넘쳐 아리랑고개보다도 넘기 힘든 다음 고개. 노인교육학과 실제의 거리는 머리와 가슴만큼 멀었다. 먼 거리였으나, 눈높이 접근으로 한 주 두 주 나아갔다. 잊고 산 단어들을 찾아보고, 갈 수 없는 고향산천을 불러보니 퉁퉁 부은 눈으로 수업 마치기 부지기수. “병원 다녔는데도 안 나아. 죽고만 싶어. 내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.”하며 가슴 치는 70대 여학생. 인민군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19세(고1)에 남하한 80대 남학생의 삶은 영화 ‘국제시장’의 전작이었다. 동경에서 광복 1달 전인 15세에 한국으로 돌아 온 후, 1.4후퇴에 가장이 되고 이혼당한 80대 여학생.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 16세 어린 나이에 일본 징용을 피하려는 19세 남자에게 시집간 여학생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였다. 잘 들리지 않는 귀에 연필 쥘 힘도 없으나 “나도 정리하고 싶어... 도와줘.” 하며 우리 반을 두드린 92세 남학생. 그 시대에 태어났기에 꼬여버린 인생의 매듭,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의 삶은 글로 흘러나왔다.
마지막 시간, 발표회다.
우리 반은 검정 정장에 흰 와이셔츠, 넥타이로 한껏 멋을 냈으나, 눈물 훔치며 자신의 글을 더듬더듬 읽었다. 300개의 눈동자가 주목하고, 기독교방송에서 취재까지 왔으니 오죽했으랴. “난, 절대 안 읽을 거예요. 시키지 마요. 절대루.”하던 여학생은 발표 후 자서전을 보여주며 자랑했다. “여긴 내가 살던 동경, 이건 한국 올 때 배 기다린 시모노세키항이구요. 참, 이때 난 중 2 피구선수였어요.” 하면서.
방학이 되고 고등학생과 수업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.
“선생님! 우리 딸과 아들, 사위가 선생님 식사대접하고 싶대요. 상담학 박사인 경희가 맨 날 우는 나를 고쳤다고 꼭 보고 싶대요. 저도 선생님 자랑하고 싶어요.” 감사했다. 수업내용이 50대 자식부터 10대 손자녀 까지 읽혀져 할머니를 보듬는 매개체가 되니. 눈물이 감사로 바뀐 피구선수 여학생은 “선생님말대로 갈렙 할래요. 딴 건 할수 없지만 아픈 사람들 눈 맞추고 손 닦아주는 것 할 수 있어요.” 하며 그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. 또 “버킷리스트 갈켜줘요.” 하더니 하나하나 지워나가겠다 한다. (80대 여학생은 헤어진 아들과 수 십 년 만에 만나 삶이 담긴 글을 전했다.)
일제강점기- 광복 - 6.25 전쟁으로 ‘나’는 없고 ‘생존’의 무게에 짓눌려 산 학생들이 “♬~ 전해라”의 주인공으로 환골탈태하고, 봉사를 준비하는 모습에 눈물 난다. 부족한 수업 끌어주고 밀어주며 지나 온 시간들. 내가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나를 가르친 시간이다. 거절 못해 시작한 수업이 어른세대를 품는 계기가 된 것과 다가올 노년을 고민할 시간됨이 감사하다. 또한 가르치는 아이에게 교과서 안 역사를 교과서 밖 이야기로 전할 수 있으니... 만약 배움의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그 분들 가슴의 멍은 눈물로 얼룩진 상태였을 것이며, 나 역시 노년을 먼 미래로만 여기며 살고 있겠지.
‘평생교육시대’에 교수자와 학습자로 만났으나, 둘 다 감사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에 고개 숙인다.
답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