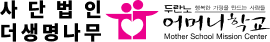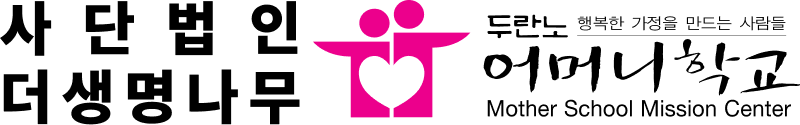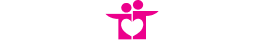게시판
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만드는
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세상
회지MOTHER
후회는 또다른 시작
- 작성자
- 이지영
- 작성일
- 13-12-19
- 조회수
- 2,288

글 | 이지영(싱가포르 9기)
 남편이 주재원 발령이 나서 싱가포르에 온지 2년이 되어간다.
남편이 주재원 발령이 나서 싱가포르에 온지 2년이 되어간다.
‘내가 해외에서 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한 일인데…’
‘나를 싱가포르로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?’ 전에도 하나님께 많이 여쭤 보았다.
몇 가지 쥐어 짜낸 답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명쾌하거나 클리어 하진 않은 답들이라 여기고 있었다. ‘그저…’ 일지도 모른다는 그 정도.
어머니학교 등록을 권유 받고 바로 신청을 하면서 내 마음에 ‘내가 싱가포르에 온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?’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이 가슴 벅차게 만들었다.
첫 날 5-6분 정도 늦은 나는 머쓱하게 우리 조가 있는 맨 앞자리 테이블에 앉으면서 현수막에 “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”라는 글 하나 봤는데 울컥하는 거다.
속으로 ‘어허~야야 벌써 부터 이러면 어떡하나! 진정. 진정해….’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난 체면유지를 하느라 애썼다. 진행하시는 분의 멘트며 주제가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찬양가사가 왜 또 그리 울컥하게 만드는지 가사를 계속 보고 있으면 거의 꺼이꺼이 울어버릴 것 같아 딴 곳을 봤다.
‘대체 뭐한 게 있다고 벌서 이 난리야. 이지영!! 강의도 듣기 전에….’
계속 난 나를 타이르듯이 다독였다.
첫 강의를 듣는데 계속 내 마음에 터치를 느꼈다.
여기저기 휴지 뽑는 모습들에 용기를 얻어 그때부터 좀 덜 참았다.
나만 듣는 강의였다면 엉엉 울었을지도 모른다.
‘이때를 위해 나를 싱가포르에 보내셨구나!’라고 말해도 될 만큼 주님은 첫 날 어머니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나를 만지셨다.
주체할 수 없이 계속 흐르는 눈물…. 애들은 “엄마! 왜 울어!”하고 물었다.
소파에 앉아 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화장실에서 실컷 울다 나왔다.
숙제를 하기 위해 애들을 빨리 재우고 숙제를 하려는데 다 울었는지 알았던 눈물이 또 쏟아진다. 적다가 울고 적다고 울고를 다 끝내니 새벽 4시가 다 됐다. 그렇게 나는 힘들었던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눈물로 씻겨내려 보낸 것 같다.
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께 편지를 쓸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. 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평생가야 절대 쓸 일이 없을 일이다.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감정들을 토할 수 있었다.
글로는 다 표현할 수도 다 적을 수도 없었지만 100분의 1만큼이나 적었을까?…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이나 울었던 것 같다. 그러면서 나는 내 안에 무언가를 쏟아 낸 것만 같았다.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.
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모든 잘못은 무능함과 무책임한 아버지 탓으로만 돌리고 살아왔기에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그가 느끼는 삶의 무게도 짐작할 수도 없었다.
2대 독자인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잃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할아버지랑 그 후 많은 새엄마들 밑에서 별 별일 겪으며 너무나 외롭게 자라서 정이 너무나 그리운 사람이라고 하셨다. 그 말이 내가 어릴 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었다.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.
그렇게 정을 그리워하는 아빠는 처자식은 어떻게 되든 자신을 따르는 친 형제나 다름없이 친한 후배나 친구의 부탁이면 발 벗고 나서는 아빠라고 생각했다.
전직 중앙정보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건 해결은 다 맡아 해 주셨다. 왜 그리 아는 사람이 많은지…. 그것도 다 이상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같았다. 더욱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보증을 잘못 서줘서 온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게 하셨다. 우리 피아노 사준다고 모았던 엄마 곗돈을 이틀만 친구 빌려준다며 빌려주었고, 이번에는 틀림없다던 돈을 빌려간 친구는 연락이 두절되고…. 우리 집에 별 사람 다 데려와 재워주고 먹여주고 가까운 친구도 아닌데 딸이 취업차 서울 올라왔다고 한 달씩 우리 집에 있게 하는 그런 아빠셨다. 겉으론 강한테 큰소리 뻥뻥 치시는데 마음은 여리디 여린 분이셨다. 그래서 사람을 너무 잘 믿어줘서 사기당하고 또 당하고 하시며 사셨나 보다. 아빠가 쓰러지시기 전 직장이 천안이라 2-3년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는데 한 달에 두어 번 주말에 오셨다.
그렇게 떨어져 지낸 후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려지셨고, 그 후 3년 만에 다시 쓰려지셨는데 그땐 심근경색으로 가족 모두 아빠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다.
‘그 병에 걸린 것도 아빠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?’ 싶다. 가족과 떨어져 사니 외로움을 술과 담배로 버티셨나 보다.
그렇게 아빤 평생을 외로움과 싸우다 가신 것 같다. 아버지께 가족이 가족 되지 못하고 보듬어 안아주지 못한 자책에 너무 괴롭고 죄송하고 가슴이 미어졌다.
그렇게 난 과거의 상처들을 재해석했나 보다.
3일째인 오늘 저녁의 일이다. 6살 큰딸 서진이랑 1살인 현민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현민이가 앉아 있다가 장난감 잡는다고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서 머리가 “쿵”하고 바닥에 닿았다.
“으앙~~”하고 울어서 달려가 안으면서 큰애를 쳐다본 것이다. ‘왜 봤을까?’ 묘한 표정을 지으며 당황스러운 이 상황을 장난기 있게 넘겨보려고 하는 큰 애의 표정이 읽혀졌다. 예전 같았으면 “옆에 있으면서 동생을 잡았어야지!” 했을 텐데….
그런데 큰애도 당황했을 그 마음이, ‘내가 못 잡아서 엄마가 야단치면 어떡하지?’ 할 것 같은 마음이 읽혀진다.
그래서 “서진아 너도 현민이가 이렇게 넘어질까라고 생각도 못했지? 엄마도 현민이가 이쪽으로 넘어질 줄 몰랐어.”라고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금방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다.
“서진아! 왜 울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. 이건 엄마도 보호해 주지 못한 거야. 울지 마!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았지.”하며 안아줬더니 한동안 내 품에서 서럽게 우는 거다.
나도 울어버렸다.
‘이 어린 것이 이만한 일로 이렇게 우는데 만일 예전처럼 나무랐다면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을 이 일을 몇 십 년 아파하며 가지고 다녔을 딸을 생각하니 오늘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….’
어머니학교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런 경험을 맛보리오. 감사했다. 모든 게.
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이 학교로 보내주시고 나를 만져주신 것이다.
답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